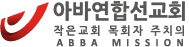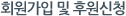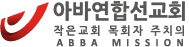|
예언자적 사명의 실종과 한국 교회의 위기
한국 사회가 격변하는 정치적 시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독재정권으로 상징되는 현 집권 세력의 등장 이후, 한국 교회의 지도층 일부에서 나타나는 기묘한 침묵과 몸 사리기 행태는 교회의 본질적 사명인 예언자적 역할의 실종을 우려하게 만듭니다.
교회의 예언자적 역할은 단순히 특정 정권을 지지하거나 비판하는 정파적 행위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성서적 정의와 공의의 잣대로 이 땅의 권력과 구조를 냉철하게 비판하고, 소외된 자들을 대변하며, 권력이 남용될 때 NO라고 외칠 수 있는 용기입니다. 하지만 최근 목회자들 사이에서 관찰되는 모습은 이러한 거룩한 용기보다는 현실과의 타협과 기득권 유지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듯합니다.
1. 침묵의 배경은 두려움인가, 실리인가?
목회자들이 이재명 독재정권에 대해 몸을 사리는 배경에는 몇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적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일부 보수 교단 및 대형 교회 지도자들은 과거 정부 비판의 목소리를 내면서 겪었던 세무조사, 건축허가 문제, 혹은 교계 내 분열 등의 경험 때문에 조용히 있는 것이 상책이라는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교단 및 기관의 안정 추구로서 교단이나 연합 기관의 수장들은 현 정권과의 원만한 관계 유지가 교세 유지 및 사업 진행에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비판적인 목소리가 기관 전체에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는 계산된 선택입니다.
정치적 피로감으로 극단적인 정치적 양극화 속에서, 교회가 또다시 정치적 논쟁의 중심에 서는 것에 대한 피로감도 존재합니다. 정교분리라는 미명 하에 사회 참여 자체를 꺼리는 경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실리적 혹은 현실적 판단은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감당해야 할 예언자적 책무를 방기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특히 정권의 실책이나 사회적 불의가 명백할 때조차 침묵하는 것은, 교회가 결국 세속 권력의 눈치를 보는 또 하나의 기득권 집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2. 성서적 사명의 왜곡
성서는 선지자들을 통해 권력의 부패와 압제에 맞서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들과 지도층은 끊임없이 선지자들의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나단이 다윗 왕의 죄를 지적하고(삼하 12장),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의 부도덕을 꾸짖었듯이(막 6장), 교회는 마땅히 당대의 권력에 진실의 거울을 들이댈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침묵은 성도들에게도 혼란을 야기합니다. 세상의 불의를 보면서도 교회가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않을 때, 성도들은 기독교 신앙이 현실 문제와 무관한 개인적 위로의 영역에만 머물러야 한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복음의 총체성과 사회적 변혁 능력을 스스로 축소시키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3. 회복을 위한 제언을 하는 용기 있는 소수의 목소리
다행히 한국 교회 전체가 침묵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진보와 보수를 떠나 소신 있는 목회자들은 여전히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들의 존재는 한국 교회의 희망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이재명 독재정권이든 어떤 정권이든 상관없이, 다음 세 가지 기준에 입각하여 예언자적 사명을 회복해야 합니다.
초월적 기준으로 특정 정치 이념이 아니라, 성서적 정의와 사랑이라는 초월적 기준에서 정치를 비판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좌우를 가리지 않고, 정권의 성패를 넘어섭니다.
약자 대변으로 권력에 대한 비판은 항상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의 관점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적 삶을 따르는 길입니다.
순결한 동기로서 정치적 발언의 동기가 교회의 사적 이익이나 기득권 보호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 왕국의 실현에 있음을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재명 독재정권에 대한 일부 목사들의 몸 사리기는 단순히 개인적 태도의 문제를 넘어, 한국 교회의 공적 신뢰와 예언자적 사명이 걸린 중대한 위기입니다. 교회가 스스로의 정체성을 되찾고, 시대의 어둠 속에서 등불을 드는 용기를 회복할 때, 비로소 세상은 교회를 다시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지금, 예언자적 목소리를 회복할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